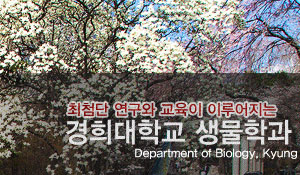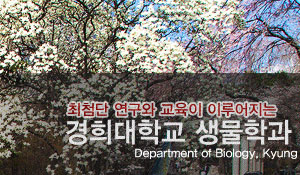<시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동물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발생 과정 중에 생성된 후, 퇴화와 재생을 반복하며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나 포유류의 망막 신경세포는 대부분 재생 능력을 갖지 않는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Prox1 단백질과 '뮬러 글리아(Müller glia, MG)'에 있다. 망막이 손상되면, MG는 일시적으로 세포주기로 다시 진입하여 증식 가능한 상태인 'MGPC(Müller glia-derived retinal progenitor cells)'로 재프로그래밍된다. 이 상태의 세포는 다양한 망막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망막 세포(BCs, Acs, HCs)에서 분비된 Prox1 단백질이 손상된 부위의 MG에 축적된다. 축적된 Prox1은 MG가 세포주기에서 조기 이탈하도록 유도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MGPC의 증식과 재프로그래밍 과정이 중단되며, 결국 시력 회복이 아닌 퇴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포 밖에서 Prox1의 항체인 αProx1을 이용해 Prox1을 붙잡아두고 MGPC에서 망막 세포로 분화하게 한다. 이제 그 과정과 효과를 알아보자.
이번 실험은 Prox1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에 추적 가능한 Prox1 단백질을 주입하여 이동 경로를관찰하며 진행되었다. Prox1 단백질은 손상되지 않은 망막에서는 혈액망막장벽에 막혀 MG에 축적되지 않았지만, 손상된 망막에서는 Prox1이 MG내에서 다량 축적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망막 재생 능력을 가진 제브라피시 망막에 Prox1을 주입하자 생쥐와 마찬가지로 손상된 망막의 MG내에서 Prox1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MG의 증식이 줄며 망막 재생또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Prox1 단백질은 손상된 망막에서 MG의 증식 능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Prox1 단백질이 감소한 MG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지 분석 및 관찰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다. 먼저 Prox1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에서 손상입은 망막을 분석했고, 3개의 MG 군집 중 한 군집에서 세포 주기로 진입 관련 단백질(Cdk4, Ccnd1, E2f5, Pcna)과 증식 능력을 가진 상태인 MGPC로 전환 관련 단백질(Notch1, Hes1, Gadd45a, Hbegf)의 증가가 관찰됐다. 반대로 Prox1 유전자가 존재하는 망막에서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감소했고 특히 Notch1과 Ccnd1의 발현이 억제되어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MGPC로 재프로그래밍을 촉발하는 단백질인 Ascl1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Ascl1 이외에 다른 요소가 MG에서 MGPC로 전환할 때 관여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런 결과를 합쳐서 볼 때 Prox1이 감소한 MG는 MGPC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실험은 Prox1의 항체인 Prox1을 이용해서 Prox1단백질이 MG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 MG의 증식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험에서 실험군은 Prox1항체 유전자를 담은 AAV(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Adeno-associated virus)를 망막에 주입하여 직접 항체를 만드는 생쥐와 대조군은 Prox1과 관련 없는 항체(Ctrl Ab)를 만드는 AAV를 주입한 생쥐이다. 그 결과 실험군은 망막 뉴런에서 Prox1 수준이 줄어들면서 Prox1 축적이 완화되었고 MG의 세포 수도 늘어남을 확인했다. 반대로 대조군의 생쥐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 망막과 차이가 없었다. 이 실험을 통해 Prox1은 MG의 증식을 억제하고 Prox1이 억제된다면 MG의 증식 능력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지막 실험은 두번 진행되었는데 Prox1의 항체인 αProx1을 가지고 있을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첫번째로 망막 재생 효과를 관찰하기위해 사용된 실험군은 광수용체가 퇴화해 시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Pde6b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생쥐이고 망막에 αProx1 유전자를 가진 AAV를 주입하여 항체를 만들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동일한 돌연변이를 가지지만 Prox1과 관련 없는 항체(Ctrl Ab)를 만드는 생쥐이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Prox1의 축적으로 대부분의 MG가 미세아교세포(microglia)로 분화함을 발견했고, 실험군에서는 Prox1 단백질 감소로 MG가 증식 및 분화하며 막대 광수용체(rPRs) 수가 증가해 시력 상승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시력 회복 효과는 단기간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새로 분화된 막대 광수용체 또한 Pde6b 돌연변이를 가져 일주일 만에 퇴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항체를 이용한 회복은 서서히 퇴화하는 망막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생후 2개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서서히 퇴화가 진행되는 RP1 돌연변이 유전자로 바꿔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전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차이점은 실험군 생쥐는 대조군 생쥐에 비해 시력을 유지해 오다가 생후 6개월일 때 시력 회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항체에 있었다. 세포가 항체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이다. 이는 AAV가 원인이고, 이미 AAV의 한계점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를 통해 시력 회복 효과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항체를 발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생물학과] 23최아름 23신예은 25장형욱
2025.10.09